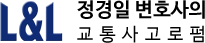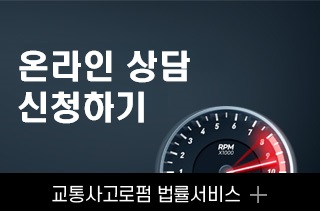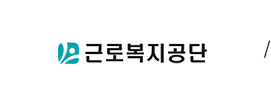절취운전, 보유자 책임이 부정된 사례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절취운전, 보유자 책임이 부정된 사례들 교통사고소송실무 |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11 | |
절취운전, 보유자 책임이 부정된 사례들
1.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절취운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을 제3자가 야간에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주는 평소 경비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했고,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했다고 믿었으나 잠금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차주의 ‘차량 관리가 현저히 허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절취 시점부터 이미 차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판단해,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해설: 아파트라는 일정 수준 보안이 있는 장소에 주차했고, 시정장치도 사용하려 했던 점을 근거로 “차량 소유자가 절취를 용인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제3자의 야간 범행을 차주가 예견·방지하기 쉽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2. 학교 운동장에 시동 건 채로 주차된 차를 절취
또 다른 사건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전남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시동 열쇠가 꽂힌 상태로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제3자는 이를 그대로 훔쳐 운전하던 중 택시와 부딪치고 도주, 이후 경찰(의무경찰)의 정지 지시마저 무시하다가 경찰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에게 열쇠 관리 부실이 있긴 하지만, 학교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절취장소와 사고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절취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컸다”는 점을 근거로 “보유자가 객관적으로 절취운전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시점에 보유자가 차에 대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결국 보유자의 자배법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해설: 분명 시동 열쇠를 꽂은 채로 뒀다는 점은 과실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절도범의 운행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해석할 만큼 중대하진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절취 후 상당 시간과 거리를 이동해 사고가 났으므로, 보유자의 즉각적인 개입이나 관리가 전혀 미칠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3. 시사점: 절취운전과 보유자 책임의 경계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열쇠 관리가 다소 허술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무조건 자배법상 보유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사고 시점에서 이미 보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완전히 끊겼다고 보면, 절취운전을 ‘보유자가 용인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차량 관리 부실이 극도로 심각해 “도둑이 훔쳐 가도 할 말 없다”고 볼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보유자에게 자배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거나, 누구든 훔칠 수 있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절취운전 사고에서 보유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보유자가 스스로 운행을 막을 의사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절취를 묵인했다고 볼 수준으로 관리가 부실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인 잠금장치와 보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불의의 절취사고에 연루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