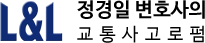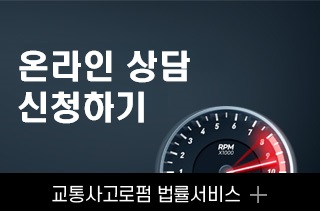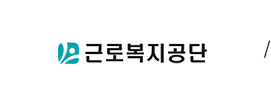교통사고로 무릎 관절이 잘 안 구부러지는데, 관절강직 측정을 자력으로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교통사고로 무릎 관절이 잘 안 구부러지는데, 관절강직 측정을 자력으로 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495 | |
[질문]
“교통사고로 무릎 관절이 잘 안 구부러지는데, 관절강직 측정을 자력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사고 뒤 다리나 팔 관절이 굳어 의사로부터 ‘관절강직’ 진단을 받았다면,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력(스스로 움직이는 힘)에 의한 측정인가, 아니면 타력(의사가 손으로 보조해 억지로 구부려본 각도)에 의한 측정인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력 측정값은 환자의 ‘실제 일상 동작’ 능력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각도를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나타내는 거죠. 반면, 타력 측정은 외부의 힘이 더해지는 만큼 움직임 각도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력 측정값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하면, 환자의 실제 상태보다 더 기능이 좋은 것으로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 측정만으로는 ‘환자가 일부러 적게 움직여서 더 나빠 보이도록 한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사나 법원은 자력·타력 두 데이터를 모두 확인해 환자의 실제 상태를 가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두 값이 크게 차이 난다면, 그 차이가 생긴 의학적 이유(통증? 근육 상태? 등)를 의사가 판단하고, 법원도 심리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결론을 끌어내야 하죠.
결론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있는 힘껏 최대한 관절을 움직여봤다”는 점을 협조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과장되지도, 축소되지도 않은 일상 생활력을 정확히 측정해야 본인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