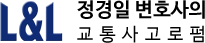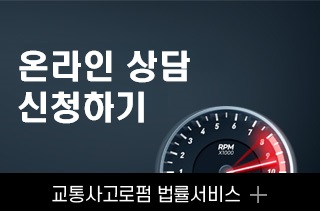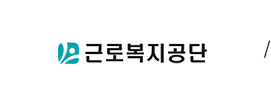사고 후 입이 잘 안 벌어지고 턱이 뻐근해요. 턱관절장애라고 하던데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사고 후 입이 잘 안 벌어지고 턱이 뻐근해요. 턱관절장애라고 하던데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485 | |
[질문]
“사고 후 입이 잘 안 벌어지고 턱이 뻐근해요. 턱관절장애라고 하던데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가 난 뒤 턱 주변을 부딪쳤거나, 충격으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어 턱관절장애(TMJ)를 호소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음식을 씹기 어렵거나 입을 크게 벌리기 불편한 상태가 이어지면, 일상생활에도 은근히 지장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턱관절장애가 노동능력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결국 법원에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표를 참고해 “턱을 어느 정도까지 벌릴 수 있는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표는 이 기준이 엄격해, 치과·구강악안면외과 감정 결과가 가벼운 수준이라면 “장애율 0%”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쪽은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거기엔 비교적 느슨하게 장애를 인정하는 항목이 있죠. 하지만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맥브라이드표를 우선 참조하는 편이 주류입니다.
그렇다면 “턱이 약간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장해율이 나온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현저한 개구장애(입 벌리기 제한)”가 나타나 맥브라이드표상 기준치 이상이면 장애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못 미치면 장애로는 보기 어렵게 되죠. 대신 법원은 아예 무시하지는 않고, 실제로 통증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산정에서 조금 더 가중하는 식으로 참작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턱관절장애가 적지 않은 불편을 주긴 해도 맥브라이드표 기준치에 못 미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0%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상세 진단·소견을 잘 정리해두고, 실제 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위자료에서라도 보상받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