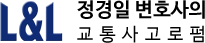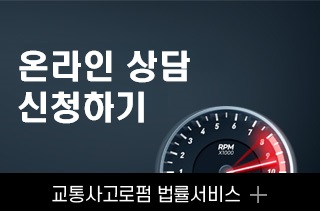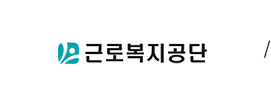해외에서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나라이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실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해외에서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나라이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실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031 | |
Q. 해외에서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나라이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실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 국적자라면, 그가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일실수입’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피해자의 미래 소득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경우, 얼마의 수입을 얻을지”를 가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죠. 한국에 잠깐 왔을 뿐인지, 아니면 장기간 머무르며 취업할 계획이었는지, 혹은 이미 자국에서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외국에서 계속 거주·근무할 예정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본국(또는 체류 중인 제3국)에서 일하면서 일정 수입을 올렸으리라 볼 수 있으니, 그 외국 기준 임금을 사용해 일실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국에서 대졸 평균연봉이 연 3만 달러다’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 근거로 피해자의 나이·경력 등에 맞춰 계산합니다.
가동연한(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도 그 국가의 통상적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편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60세 정년을 보는데, A국은 62세라면 그 국가 정년을 반영해 주기도 하죠.
단기 체류(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등) 외국인
만약 애초에 한국에서 잠깐만 머물 계획이었다면, ‘본국에서 미래 수입’을 전제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뒤 어떤 직업·학력·경력을 활용해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혹은 익히 해오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근거로 삼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합법·불법 여부)
합법적으로 체류해 한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줍니다. 여기엔 “체류기간 갱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갱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는 직종(예: 고기술 분야)은 임금 계속성을 전제로 삼을 수 있는 반면, 갱신 가능성이 낮다면 체류만료 뒤로는 본국 임금 기준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면,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무 중이었을 수 있는데, 실무에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한국서 일했을” 임금을 인정하고, 그 이후로는 본국에서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나누어 계산하곤 합니다.
사고 전후 체류변화가 있었는지 확인
간혹 사고로 인해 법적 소송 중인 사이 체류 기간이 지나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한국 임금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갱신 절차나 고용주 보증 등 별도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더 인정받기도 합니다.
결국, 외국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때에는 “장래 주거 국가가 어디인지, 합법 근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어느 국가의 임금을 적용하고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 결정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국에서 합법 취업이 가능했는지, 체류 자격이 어떠했고, 갱신 가능성이 높았는지, 혹은 본국에서의 임금 수준은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