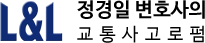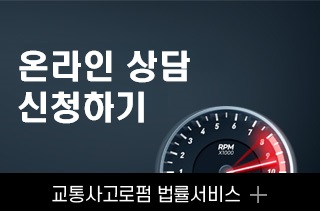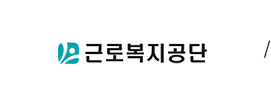사고 뒤 직장을 잃었는데,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다고 법원이 봤다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사고 뒤 직장을 잃었는데,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다고 법원이 봤다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12 | |
Q: “사고 뒤 직장을 잃었는데,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다고 법원이 봤다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요약: 회사 도산 및 전업 사례에서 법원 심리 포인트)
A: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폐업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잃었다면, 기존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법원이 어떻게 추정해줄까가 중요하죠.
1) “나이·경력·기술” 종합 평가
법원은 흔히 “사회경험과 나이, 건강상태, 학력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다른 업종에도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대학 졸업 직후 입사했고, 사고 전까지 오랫동안 특정 업무 능력을 쌓았다면, “비슷한 업계로 이직했을 거다”라는 가정이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혀 시장성이 없는 기술이거나 고연령으로 새 고용이 매우 어려웠다든지 하면, 정규 일자리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2) “통상적 노임” 기준도 가능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없이 근무했다면,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예: 정부 노동통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전업이 가능하긴 하나 안정적이고 고수익 직종에선 일하기 힘들다”며, 평균노임으로 잡는 식이죠.
3) 사고 당시 회사 부도와는 무관한 경우
실제론, “회사의 도산은 피해자 본인의 사망(또는 상해)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면, 가정상 “원래도 거기서 버틸 수 없었을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법원은 “사고가 없었으면 그래도 전업해서 수입을 유지했을 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이 폐업·도산한 경우, 과거 직장 임금을 곧바로 일실수입 계산에 쓰지 않고, 피해자의 재취업·전업 가능성을 탐색해 “실질적으로 얻었을 법한 소득 수준”을 찾아내는 게 법원의 일반적 판단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존 회사만 계속 다녔으면 정년까지 소득 보장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업 후 예상되는 소득을 기초로 손해를 평가하는 게 실무 관행입니다.